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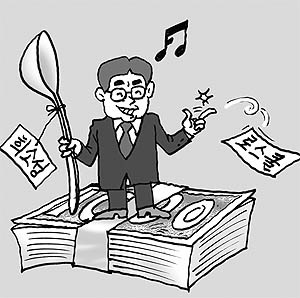
요즈음 논란이되고 있는 로스쿨 정원문제는 법조계의 기득권과 관계된다. 법조계는 한결같이 로스쿨 정원을 1500명선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변호사 숫자를 지금처럼 희소화시켜 기득권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변호사가 많아지면 그만큼 수임료가 낮어져서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법률 소비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로스쿨 정원이 많아지는 것을 원한다. 이런 논란은 조선사회에서 토지를 놓고 벌어지는 갖가지 분쟁을 예상케한다. 과거에는 토지가 백성의 생명줄이었다.
관리나 군인에게는 과전(科田)이 주어졌는데 자손들에게 세습은 허락되지 않았다.그러나 갖가지 편법이 동원되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휼양전이라 하여 관직을 떠났어도 모셔야할 늙은 부모가 있을때는 과전 경작이 허락되었으며 관리 남편이 죽었을때에도 남어있는 자식들을 위해 수신전으로 용인되었다. 이런 편법동원 때문에 전국의 과전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다 영조때까지 28번의 공신(功臣) 책정이 있었는데 공신이란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웠거나 반란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운사람에게 공신전(功臣田)으로써 방대한 토지를 주었다. 공신전은 자손대대로 세습이 가능하여 일단 공신으로만 책정되면 그집안은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릴수 있었다.
조선왕조에 공신책정이 28번 있었는데 1등공신의 총인원은 152명 2등공신에 책정된 사람이 278명 3등공신에 오른 사람이 112명, 도합 542명이다.1등공신에게는 150결(結)에서 220(結)의 토지와 노비를 15명에서 30명까지 2등공신 에게는 100결의 토지와 노비10명을 3등공신 에게는 70결의 토지와 노비 7명을 하사했다. 조선사회에서 토지 면적 단위인 결(結)의 의미가 분명치는 않지만 1등공신에게는 약 1백만평의 논이 주어졌다는 주장을 감안하면 공신전이 전국토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엄청났었다는 것은 짐작할수 있다.
농경사회에서의 기득권이 토지 경작권이라 한다면 한국이라는 산업사회에서의 기득권중의 하나는 바로 변호사들의 희소성이다.변호사 숫자가 많을수록 수임료는 낮어지기에 국민들은 박수를 치고 변호사들 수입은 낮어지기에 법조계는 기득권 수호에 전력을 쏟는 듯 하다.
오목대
백제금동대향로가 건네는 질문 교사·교수·행정가, 적임자는? 우물안 개구리(井底之蛙) 노인일자리 사업의 방향 부자 전북, 가난한 전북 마천루 위에 앉은 AI설계자들 [오목대] 호가호위(狐假虎威)의 계절 광주 전남 반면교사로 삼아라 세계유산,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수능만점과 전북의 네 탓 공방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