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공감] 고창 심원면 사등마을 - 하늘과 땅, 사람 향해 1500년 갚아온 은혜, 자염
백제 때 검단스님이 전수 / 자염박물관 지어 명맥 되살려 / 슬로푸드마을 선정되며 체험관광으로 다시 '날개'
“뭍이면서 물이고 물이면서 뭍인, 겹침 공간 염전. 겹쳐 있다는 것은 이편이기도 저편이기도, 혹은 아무 편도 아닌 것이다. 그래서 그 ‘폐(閉)’는 진즉 예정된 것인가. 뭍에서 물로 염전의 물거울 표면을 파르르 흔들며 부는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려, 뙤약볕 아래 늙은 염부들이 은빛 거울 속으로 첨벙 들어가고 있다. 그들은 다시 뭍의 세계로 나올 수 있을까? 폐염전 한 귀퉁이에서 훅훅 거친 숨을 터뜨리는, 아직은 ‘살(殺)’이 아닌 산 풍경을 그린 책이다.
(책읽는 경향, 2010년 3월, 〈소금이 일어나는 물거울, 염전〉)”

△새로운 소금밭 이야기, 자염(煮鹽)
꽤 오래 전 어느 신문에 서평으로 낸 글이다. 유종인 작가가 글을 쓰고 사진 찍고 눌와에서 펴낸 책, 〈소금이 일어나는 물거울 염전〉에 대한 짧디 짧은 서평이다. 그 많은 책 가운데 뭍도 아니고 물도 아닌 갯벌, 염전에 대한 책이라니, 세계적인 갯벌을 가진 고창, 바닷가 해리에서 태어난 탓이다.
고창은 염전의 고장이다. 1900년 이후 대규모 간척 사업이 일본인들의 손으로, 우리 손으로 벌어진 흔적이다. 바다로부터 땅을 얻기 위한 쟁투(爭鬪)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었다. 깊이를 모르는 바다에 등짐으로 한짐 한짐 산을 허물고 들을 파내어 들이 붓는 일이었으니 말이다. 그 끝없는 싸움의 결과는 세 갈래다. 삼대가 망하든, 들이 되든, 염전이 되든이다. 들이든 염전이든 땅이 되는 그 갈래야말로 삼대가 흥청거리고도 남을 일. 염전에 대한 소리소문은 어렸던 나에게도 장대한 드라마로 들렸을 것이다. 그 천일염전만 알고 살았다. 다시 고향에 돌아와 어른의 눈으로 본 새로운 소금밭 이야기가 흥미로웠다. 자염(煮鹽)이다.

△은혜갚은 소금, 보은염 이운행렬로 이어져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대규모로 형성된 천일염전과 달리, 자염은 우리나라 서해안 너른 갯벌에서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는 소금이다. 고창군 심원면 사등마을 검당포에는 독특한 자염짓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무려 1500년이다. 호남을 대표하는 선운사를 창건한 검단선사에 얽힌 이야기다. 577년 백제 위덕왕 시절, 검단스님은 당시 민중들에게는 아주 낯선 불교라는 새로운 ‘믿음체계’를 어떻게 전해줄까, 고민했다. 종교 안에 삶의 방편, 곤궁한 생활을 타개할 새로운 신기술 전수를 끼워 넣는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소금 굽는 방법의 전수다. 소금이야말로 대사작용의 기본일 뿐 아니라 모든 음식의 기본이다.
물론 이 땅에서 검단스님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소금은 만들어왔겠지만, 그가 전한 자염의 제염방식은 획기적인 것이었으리라. 호구를 해결해준 스님의 덕망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을 터, 오늘날 대 가람 선운사가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묘책이었을 것이다.
그 흔적이 해마다 봄 가을이면 자염으로 소금을 짓는 사등마을 사람들이 산 넘어 선운사에 농사지은 자염을 공양하는 ‘보은염 이운행사’로 남아있다. 검당포라는 지명 또한 말없이 선운사 검단스님과 뿌리깊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벌막에서 갯벌과 바람과 함께 한올 한올 엉겨낸 소금 알갱이
모래가 많아 붙여진 이름 모랫등, 사등마을에서 한창 소금을 구워내던 때에는 제법 큰 지역에 300여 호가 넘었다고 한다. 동학의 거대한 불길이 온 고창 땅을 휩쓸고 그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말없이 흥건하던 무술년(1896년)이었다. 거대한 해일이 밀려와 마을은 통째 사라지고, 겨우겨우 남은 사람들이 지금 이 모랫등에 다시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사등마을에는 자염박물관이 있다. 마을 집집마다 간직하던 자염도구들을 내어놓고 소금이 태어나는 과정을 종이인형으로, 그림으로 쉽게 풀어 내어놓았다. 박물관 앞마당에는 이미 사라지고 만 벌막도 재현해놓았다. 선운사에 이르는 길다란 만(灣)을 따라 수십 수백에 달라던 벌막은 이제 대문안벌, 막벌, 새벌, 안벌 같이 지명으로 흔적만 남았다. 작은 집 한 채만한 그 벌막에서 염부들은, 소금기 머금은 갯벌흙을 걷어내 섯구덩이에 맑게 거르고 그 거른 염도 높은 물을 길러 커다란 무쇠솥(지금은 네모난 철판 솥이다)에 넣고 불땀 좋은 불길로 끓여내, 한올 한올 소금을 엉겨냈을 것이다.
△체험·관광으로 날개 다는 ‘슬로푸드 사등마을’
그 소금 짓는 풍경이 다시 살아났다. 그야말로 산풍경(살풍경이 아닌)은 사등에서도 고스란하다. 전라북도가 지역의 이야기와 전통이 깃든 음식으로 마을을 되살리자는 ‘전북형 슬로푸드마을’에 2015년 선정되면서부터 급물살을 탄다. ‘체험 관광형’이라는 수식이 붙은 이 마을재생사업은 그동안 마을 자원을 잘 꾸며 박물관은 물론 사라진 벌막까지 재현해놓은 그 바탕 위에서 시작되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잘 다듬어온 자염이라는 마을 자원에, 이제 ‘체험’과 ‘관광’이라는 날개를 달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슬로푸드마을에 선정되고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80대 어르신부터 바다 일에 틈이라고는 하나 없는 장년층 주민까지, 그동안 마을이 정체된 아쉬움을 단번에 풀어내려 내놓는 의견이 끝이 없었어요. 그 의견 하나하나 서로 귀 기울여 듣고 중요한, 가장 시급한 것들부터 차례를 정해나갔죠.” 무급 마을사무장으로 마을이 정한 방향을 지켜가는 정정선(56) 씨의 말이다.
△자염, 인류에 내린 하늘의 선물보따리를 풀며
서로 듣고 말하며 사등마을 사람들의 고민이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다. 지난해 완공한 ‘자염체험관’은 전통방식으로 자염만들기, 오색 자염 만들기부터 미니어처 작은 벌막 만들기, 조개 공예 등 마을 자원을 체험으로 연계한 노는 듯 공부하는 체계를 잡았다. 더불어 마을에서 운영하는 검당팬션에서 편안한 하루를 묵어갈 수도 있다. 자염이 밑간이 되고 해풍이 들녘에 내린 풍요로운 산물을 마을 아짐들의 솜씨로 다듬어 올린 자연밥상을 기대한다. 복분자에 장어 일품요리라면 두말할 것 없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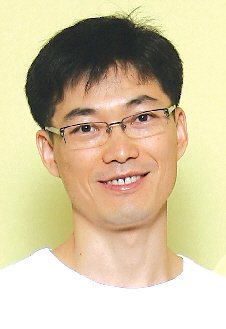
사등마을의 다음 차례는 브랜딩한 자염의 홍보 마케팅이다. 하늘염 상품으로 자염 선물세트를 구성했고, 국제 슬로푸르 좋은 먹거리 ‘맛의 방주’에 등재한 사등마을 특산 ‘칠게젓갈’이 상품화 채비를 마쳤다. 더불어 ‘자염체험관’과 ‘자염박물관’, ‘검당팬션’의 활성화다. 그러고 나서 본격적인 체험 휴양체험마을로 자리잡는 것이다. 자염으로 지어낸 자연음식 밥상으로 편안한 쉼으로 세상과 만나려는 것이다. “근디, 자염이 왜 좋은지 아요?” 정 사무장은 사등의 자염은 염도가 낮고 무기질이 많아, 피를 맑게 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한다, 염증치료에도 효험이 크다고 한다.
자염에 얽힌 역사며, 스토리텔링이며, 상품화며, 체험이며, 소득과 마을의 풍요에 앞선 가치, 자염만의 가치를 놓칠 수 없다. ‘자염’이 좋은 것이다. 인류에 내린 하늘의 선물이니.
이대건 책마을해리 촌장
※시민기자가 참여하는 ‘문화&공감’은 매주 수요일 연재됩니다. 이대건 책마을해리 촌장, 문성희 문화파출소 문화보안관, 고길섶 문화비평가, 문정현 역사문화연구가가 차례로 글을 씁니다.






 홈
홈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