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자치도와 '도시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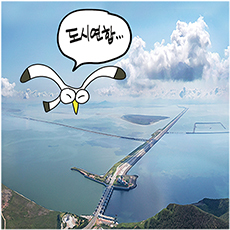
‘도시연합’은 ‘인구 성장과 물리적 확장을 통해 여러 도시가 하나의 산업화된 개발 지역으로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도시를 구성하는 지역’을 이른다. 비슷한 개념으로 ‘연합도시’나 ‘연담도시’가 있지만 ‘단순한 도시의 집합이 아니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기능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 도시와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화로 도시가 확장되면서 오래전부터 이런 도시의 새로운 기능이 요구됐지만 최근 부산 울산 경남이 도시연합의 기능을 앞세워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공식 출범하고, 강원도가 오랜 노력 끝에 특별자치도의 이름을 얻은 것 말고는 실질적(?) 결실이 아직 없다.
이러한 도시연합을 일찌감치 제안했던 건축가가 있다. 몇 해 전 작고한 김석철 교수(희망의 한반도 프로젝트, 2005년)다. 그의 제안 중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도시연합이 있다. 앞으로 도시는 '농업시대에서 해양시대로 간다'는 것이 그의 분석. 세계의 대부분 도시가 전 세계를 상대로 살아남아야 하는 환경에서 그가 주목한 것은 ‘물류’다. 물류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는 방법은 바다를 이용하는 것. 그가 가장 가능성 있는 도시(?)로 새만금을 주목한 이유다.
중국 동부 해안의 도시에는 세계적인 부자들이 모여 있다. 흥미롭게도 우리나라에서 이곳과 가장 가까운 곳이 전라북도다. 그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도시 간 네트워크와 ‘황해연합’을 제안한 바탕이다. 그러나 그는 한 개의 구역이 작게 쪼개진 형태의 지방자치제에서는 확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전북과 충청남·북도는 금강 수계 중심으로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던 그는 ”역사와 지리와 인문이 통합되어 자립 가능한 지방 경제권을 이뤄내면 그것이 바로 하나의 국가가 된다. 전북과 충남·북, 그리고 중국의 일부 성이 연합을 이루면 서해와 롄윈강, 중국 횡단 철도 등을 통해 전주에서 유럽으로도 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중국의 롄윈강 쪽과 연합하면 전북의 부족한 인구문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조언도 있다.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사례는 적지 않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자위더르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가로지르는 네바강 네바만, 이탈리아 베네치아 모세의 방벽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인 예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 후보들이 도시연합 형태의 도시 만들기를 내세웠다. 전북의 도지사 후보들도 메가시티 대응 전략으로 전북의 독자 권역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다. 특별자치도의 궁극적 목표는 권한과 정부의 예산지원을 늘리는 것일 터.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보아서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새만금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도시연합’을 먼저 주목해보는 것도 좋겠다./김은정 선임기자






 홈
홈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