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물질 검출 등 적발…대부분 시정명령 그쳐 / 광주식약청서 관리 맡지만 인력 턱없이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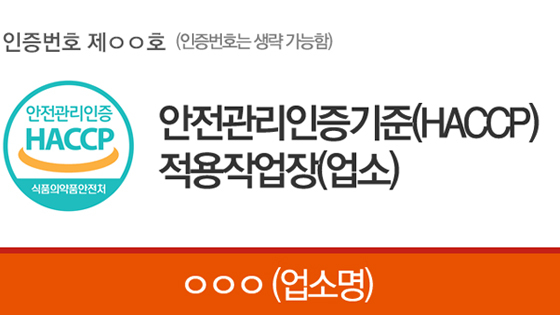
음식물에서 청개구리, 메뚜기가 나와도 업체는 영업을 계속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업체 이야기다.
최근 살충제 계란 파문 등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관심이 하늘을 찌른다. 해썹 업체 제품은 국민이 믿고 구매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이 생산한 제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되고 위생취급 기준을 위반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어긴 업체들이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는데도 여전히 해썹 인증을 유지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썹의 배신’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에 해썹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두 차례에 걸쳐 알아본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지면서 해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식약처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해썹 업체 중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곳이 59개소에 달한다. 적발 건수로는 67건이다. 전국적으로 980개소에 달하는 해썹 인증 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도내 업체에서는 이물질이 검출된 경우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취급기준 위반이 9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8건, 표시기준 위반 7건, 시설기준 위반 4건 등이다.
이같이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도 이 같은 위반사항들이 적발됐지만, 처리 결과는 모두 시정 명령 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29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는 21건이었다. 반면 영업정지는 4곳에 그쳤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해썹 인증을 받고도 식품위생법을 잇따라 위반하는 업체도 있다.
도내에서 김치를 제조하는 한 공장은 2015년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같은 해 기준규격미달, 2016년 이물질 검출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올해에도 이물질이 검출돼 3년 새 4번이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또 다른 도내 제과 공장에서는 2013년 이물질이 검출됐고, 2014년에는 표시기준 위반, 2016년에도 이물질이 검출됐다. 해당 업체들은 여전히 해썹 인증을 가지고 영업 중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불량식품 근절 등을 이유로 해썹 인증을 장려했다. 기존 7개였던 식품 해썹 의무 품목도 16개로 대폭 확대됐고, 소규모업체들까지 해썹 인증을 받도록 했다. 실제로 2012년 전국적으로 1809곳이던 해썹 업체가 2016년에는 4358곳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 때문에 인증 업체를 늘리는 것에만 치중하고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정부에서 인증 실적 쌓기 식으로 해썹제도를 확대하느라 부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후 관리를 맡은 식약처의 인력문제와 함께 지자체에는 해썹과 관련해 인증을 독려하는 역할을 제외하고는 마땅한 감시체계가 없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된다.
일례로 전북지역을 담당하는 광주지방식약청의 경우 해썹 담당 직원은 4명에 불과하고, 전문가들로 이뤄진 지도관은 6명에 그친다. 광주식약청이 담당하는 관할 구역은 전북·전남·광주·제주 지역으로, 전북지역에만 농장을 제외한 해썹 인증을 받은 식품 업체는 614곳에 달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