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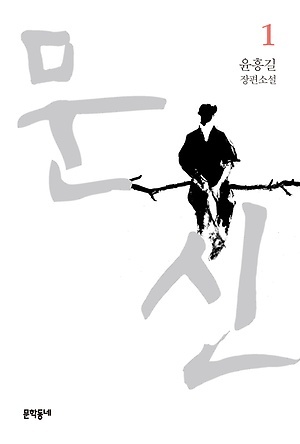
삼월도 한 열흘 지나자 봄비가 내렸다. 본디 그러한 모양인지, 봄비 내리는 하늘은 이마 언저리까지 무겁게 내려와 있다. 손바닥으로 싹 훔쳐내듯 봄비 그치고 나면, 부쩍 높아진 하늘 아래 빈자리마다 다투어 꽃이 필 것이다. 그래서일까. 봄비는 생명의 전령처럼 공중을 달아나기 바쁘다. 이렇게 봄비에 유난한 이유는 윤흥길의 장편소설 <문신> 때문이다.
‘집필에서 출간까지 20년’ ‘거장 윤흥길의 필생의 역작’ 같은 수사는 잠시 접어두기로 하자. 어차어피 <문신> 의 진면목은 그러한 수사가 아니더라도 밤하늘에 콱 박혀 있는 별만큼이나 도드라지게 되어 있다. 그것은 윤흥길이라는 큰 작가에 대한 믿음처럼 정확한 일이다. 오히려 <문신> 에서 눈여겨 읽고 싶은 지점은, 봄비에서 연상된 것처럼, 낮게 드리워진 시대와 역사의 무게를 버티며 각자의 삶을 쥐고 흩어져가는 ‘개인’의 생명력이다.
약간의 비약을 감안한다면, 겨우내 얼었던 땅속까지 스미어 세상을 향해 생명의 활력을 밀어 올리는 봄비의 상징은, 장편소설 <문신> 에서 전쟁에 끌려가는 남정네들이 자기 몸에 먹물을 스며들게 하는 행위에 닿는다. 전쟁에 나가 죽을 경우 시신으로라도 귀환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생겨난 ‘부병자자’(赴兵刺字) 풍습은 죽음보다는 삶을 향한 무의식적 욕망을 드러내는 것 같다. 죽어서도 돌아오겠다는 지극한 생명력은 소설 속 인물들이 저마다 심중에 새긴 각오와 다를 바 없다. 천석꾼 최명배의 물욕이 그렇고, 폐병을 핑계로 끊임없는 자책과 자학으로 스스로를 소모해가는 장남 부용이 그렇다. 이종사촌 배낙철과 어울려 유약한 사회주의자가 된 둘째 아들 귀용과 ‘야소구신’으로 불리는 최명배의 큰 딸 순금도 다르지 않다. 최명배가 1937년 중일전쟁을 정점으로 파국으로 치닫는 우리 민족의 무거운 그림자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소설 속 인물들은 캄캄한 시대의 어둠을 헤어나가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친다.
이처럼 윤흥길의 장편소설 <문신> 은 이마를 무겁게 내리누르는 시대와 역사의 틈바구니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숨통을 틔워가는 인물들의 몸부림을 유려한 문장으로 곡진하게 펼쳐ㅂ인다. ‘큰 문제에 대해 큰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는 작가의 말처럼, <문신> 은 다른 말 할 것 없이 큰 소설이다. 이 소설을 읽지 않는다고 해서 봄꽃이 아니 필 리 없지만, 짧아지는 봄밤을 큰 소설로 지새우는 일도 봄꽃의 향을 더하는 일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문신 시인은 2004년 전북일보와 세계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동시와 문학평론이 각각 당선되어 다방면에서 글쓰기를 해오고 있다. 그동안 시집 <물가죽 북> , <곁을 주는 일> 과 문학연구서 <현대시의 창작 방법과 교육> 을 냈으며, 지금은 <문예연구>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