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번 더 돌아보고 싶은 순간들은 얼마나 절절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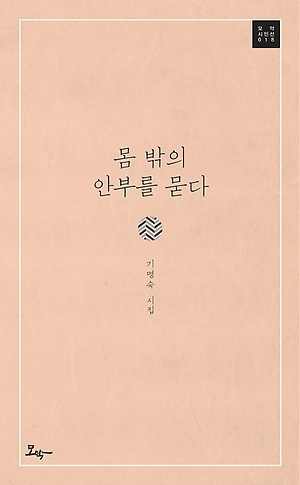
몇 번을 적었다 지워낸 칠판처럼 하늘에 백묵가루 떠다니는 세밑이다.
이맘때의 들길 더는 아무런 생각 없이 몇 줄 기러기 안동하고 걷는다. 익은 발씨가 모처럼 서툴다. 가지런한 길이 조금 굽어보이고 사람의 마을이 어떤 경계처럼 새 떠 보이는 곳까지 헤맨다. 이윽고 한 곳에 오래 서 있는 듯한 느낌이 오면 과연 가슴속이 텅 비는 것이다.
그 다음, 맨 먼저 오는 말간 생각이 있다.
기러기 울음에 실리던지 그 기슭을 찰랑거리는 허공으로 오던지. 홀연 절절해지는 생이 있다. 자기연민이든 애증이든 무슨 소용인가. 그 순간 내 것이 아닌 삶이 내 안에서 텃새부리거나 엄살을 떨거나, 무방하게 내버려둘 때가 있다.
인생이 뭐냐 주책없이 묻고 싶을 때
황송하게도 <몸 밖의 안부> 를 묻는다. 내 것이 아니기를 바랐지만 필경 내 것이었던 뒤안길이 고스란히 들길을 밟으며 단색판화 같은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아직 한 번 더 돌아보고 싶은 순간들은 얼마나 절절한가.
주어진 것이던 남몰래 훔쳤던 것이던, 막연한 희망사항이었던 박쥐의 생태를 답습하였든 스스로 열렬했다면 그의 생은 사실이다. 그 기억은 당연히 솔직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은 대체로 세 종류로 살아간다. 법적인 인간, 도덕적인 인간 그리고, 양심적인 인간이 그것 일 터이다. 그 중‘양심적이다’함은 나와 타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나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마음의 본질을 이름일 거다.
시의 본질이 그에 따른다 치면 시인은 양심적인 부류에 속한다. 그래서 늘 혼자 괴롭다. 깊은 밤 등불을 끄지 못하고 갈등하는 애꿎은 짐승일 터.
“저녁마다 지워지는 그 아름다운 실패작”덧없이 되풀이하는
생을 맨 앞에서 자백한 처녀시집은 이 한 문장으로 족할 수 있다. 주관과 객관 사이에서 공명하던 생을 자기만의 업業인 듯 수줍게 중얼거리는 시인의 자화상에 페이소스가 짙다. 그 기록은 낯설지 않으면서 또한 미답未踏이다. 익숙한 것이 고개를 갸웃하게 할 때가 새로운 법,
첫눈이 내릴 듯한, 첫눈을 기다리는, 그 첫눈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과 희디 흰 눈빛을 겹치고 싶다.
* 김유석 시인은 김제에서 출생해 농사 지으며 살고 있다. 1989년 전북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었고 이어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시,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동시가 당선되어 활동 해 왔다. 그 동안 <상처에 대하여> <놀이의 방식> , 두 권의 시집을 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