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은사는 송만갑·정정렬·정형인"…풍류방 음악인들 접촉, 자신의 예술세계 구축…춤에 대한 '남다른 열정' 판소리 대가로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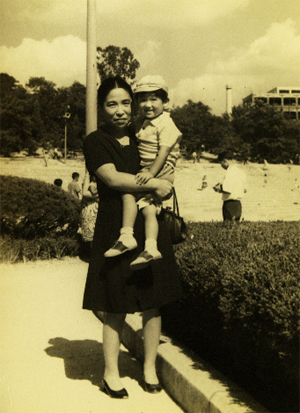
김소희 자신의 말에 의하면, 김소희는 열세 살 때 광주에서 이화중선의 협률사 구경을 갔다가, 이화중선의 등록상표처럼 되어 있었던 <추월만정> 소리에 반하여, 당시 광주 권번에 있던 송만갑에게 소리 공부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송만갑에게 소리를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쯤 되었을 때 이화중선이 송만갑을 찾아왔다. 이 때 송만갑은 이화중선에게 보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서 김소희를 소개했고, 김소희의 소리를 들어본 이화중선은 김소희를 당장 데리고 가겠다고 졸랐다. 송만갑의 허락을 받은 이화중선은 바로 그 날 저녁 광주극장의 공연에 김소희를 출연시켰다. 김소희의 데뷔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다. 이어 김소희는 소리를 더 배우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 이모님 댁에 머문다. 이 때 이름자 중에서 가운데 '옥' 자를 '흴 소(素)'자로 바꾸어 '소희'로 고쳤다고 한다. 이 때는 주로 송만갑에게 <흥보가> 를, 정정렬에게 <춘향가> 를 배웠다고 한다.
이 무렵 김소희는 틈틈이 정읍과 전주에서 정악과 춤을 익혔다. 김소희 자신의 증언에 의하면, 정형인과 손창식한테 춤을, 태인의 전계문에게 가곡과 가사를 배웠다고 한다. 정형인은 1930년대에 정읍과 전주 지역에서 춤으로 이름을 떨치던 정자선의 아들인데, 무용을 잘해서 후에 전주농고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다. 손창식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전계문은 춤·북(판소리 장단)·가곡·가사의 명인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전계문은 1930년대 이후 정읍지역 민속 예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다. 명창 전도성과는 당질간으로 북을 잘 쳐 전도성의 수행고수를 했으며, 춤과 가곡·가사에도 일가를 이루었다. 김소희는 또 태인 출신의 김용근에 대해, '그 영감님이 거문고를 타고' 자신이 음악(가곡)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용근은 1895년 태인 출신으로, 정읍과 고창 지역의 율계(律契)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한 거문고의 명인이었으며, 1963년에 타계하였다.
김소희가 판소리를 배우던 초기에 전계문, 김용근 등 정읍과 고창지역의 대표적인 풍류방 음악인들과 교유를 가졌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가곡과 판소리는 격이 다른 예술이었지만, 조선조 후기에 이르러 영향력 있는 패트런에 의해 공통적으로 향유됨으로써 상호 교유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판소리 광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뿐만 아니라, 판소리 그 자체도 귀족화·고급화되는 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소희는 풍류방 음악인들과 접촉함으로써 풍류방 음악의 음악관을 접하게 되었고, 후에 이를 자신의 예술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중요한 지침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판소리보다 격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던 풍류방 음악인들의 음악관을 판소리 창자인 김소희가 쉽게 모방하고 따랐을 가능성은 다분하다. 실제 김소희는 '정음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판소리도 제대로 할 줄 안다'고 주장하였다. 김소희가 '우아한 판소리'를 추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풍류방 음악을 접촉한 데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김소희가 판소리 수업 초기에 대가로부터 춤을 배웠다는 것도 중요하다. 판소리에서 육체적 표현은 연기와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김세종 같은 이는 사실적 연기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소희는 줄곧 '발림'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춤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김소희가 이와 같은 발림관을 갖게 된 것 또한 춤에 대한 남다른 소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김소희는 자신은 '은사가 세 분 계셨다'고 하면서, 송만갑, 정정렬, 정형인을 들고, 정형인으로부터 고전 무용을 배운 것을 강조하여 말한 적이 있다. 그의 말에 비추어 보면, 송만갑, 정정렬, 정형인, 이 세 사람이 김소희의 예술의 형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 만하다.
/최동현(군산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