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우는 시 아닌 비우는 시
시인 송 희 '설레인다 나는, 썩음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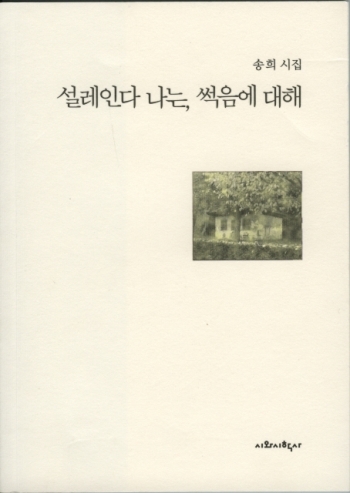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설다. 문인들 행사장에서 좀처럼 얼굴을 비추지 않는다. 그러나 "아니다" 싶을 땐 작심하고 할 말은 한다. 야물고, 딴딴한 인상을 주는 것도 이런 까닭일 것이다.
그의 '싹'을 일찍부터 알아본 출판사'시와 시학사'가 두번째 시집'설레인다 나는, 썩음에 대해'를 재촉했다.
50여 편의 시는 지난 9년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였음을 보여준다.
오랫동안 마음공부를 해온 시인은 "모든 것이 문드러질 때 올라오는 신비함과 솟아나는 힘. 나이와 상관없이 세상에 호기심이 생겨 구석구석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서 "출판사가 표제작을 참 잘 뽑았다"고 했다.
어려서부터 날마다 일기 쓰듯 시를 썼다. 학교 대표로 백일장에 나가 상을 곧잘 받았으나, "딱히 시인이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막연하게 내 시가 교과서에 실리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하곤 했다. 이운룡 시인의 부추김으로 '시인'이란 직함을 달고도 조바심을 내지 않았다. 첫 시집'탱자가시로 묻다'로 안팎에서 호평을 받을 때 안면도 없는 서정춘 시인이 "미친놈들 이야기에 속지 말라"고 채찍질했다.
그로부터 5년 뒤, 어느 잡지에 실린 그의 시('구름 죽죽 찢어먹는 여자')를 본 뒤에서야 "진중하게 잘 쓰고 있다"고 칭찬해주었다.
"(서정춘 선생님은) 제목 하나를 결정짓는 데 40일을, 8행짜리 시를 쓰면서 2달 반을 고민했다고 하셨어요.
시를 발표할 때 마다 그 분 말씀을 떠올리게 되죠. 무르익어서 한 숨에 풀어질 때까지 담고 있는 편이거든요. 어차피 많이 쓰는 재주도 없고, 가슴이 시키는 대로 쓰려고 합니다."
그의 시세계에서 '마음공부'는 불교적으로 해석되든 자연의 순리를 빗댄 것이든 빠뜨릴 수 없는 주제어. 때론 가을 들판의 쑥부쟁이처럼 가녀리게 흔들리고('삼월눈꽃'), 때론 신들린 무당처럼 가슴 꽂히는('감자에 싹이 나서') 시가 읽힌다. "내 시가 난해하고 어렵다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이제 알겠다"는 시인은 9년 전 세상에 대한 무궁무진한 궁금증으로 꽉 찬 마음 대신 수행을 통해 닦은 비어있는 마음을 보여주었다.
'냉장고 뒷구석에 숨어든 사과 하나 / 제 배꼽 쪽으로 당기고 당겨 / 주름에 절여졌다 / 귀를 어지럽히던 바람소리도 / 스폰지처럼 달디 달아졌다 / 푹신한 골방이 되었다 / 동안거 마지막 날 / 툭, 칼집을 넣어본다'('주름의 안쪽' 중에서)
타자를 인식하지 않는 건, 그래도 될 만 하니까 그러는 것일 게다. 이런 걸 두고 진정한 의미의 해방이라고 하지 않을까.
전주 출생으로 1996년 '자유문학'으로 문단에 나와 첫 시집'탱자가시로 묻다'를 펴냈으며 '전북시인상', '전북문학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홈
홈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