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원광대 감로탱화 - 1750년대 전문연희패들 모습 세밀하게 묘사…한국 음악사 연구 중요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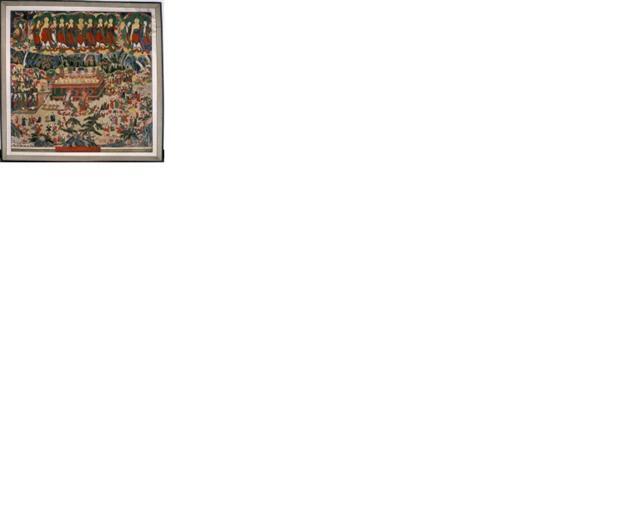
감로탱화는 불교미술의 상징 주의적 성격과 함께 불교의 극락왕생과 조상숭배, 영혼숭배신앙과 같은 현실적이며, 사실주의적 성격이 결합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감로탱화는 일반 중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인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하게 해주는 것과 동시에 중생을 구원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있어서 조선시대에 매우 성행한 유물이다.
1750년에 제작돼 원광대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감로탱화는 감로탱화의 전형적인 모습을 담고 있으면서 한국음악사 연구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 탱화에는 춤추는 무희와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 등이 비교적 풍부하고 세밀하게 묘사돼 있어 당대 전문연희패들의 모습을 담담하게 그려냈다.
상단, 중단, 하단으로 구성된 이 탱화의 하단에는 춤과 음악을 상론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특히 소나무 아래에는 술에 취해 싸우는 사람들, 바둑을 두는 사람들, 예인집단들의 모습이 묘사돼 있다.
먼저 예인들의 모습에는 곡경비파, 장고, 해금, 횡적 등으로 연주하는 악인들과 뒷모습으로 보여 상론할 수 없지만 광쇠, 바라, 요령을 치는 악인 등도 보인다. 여기에 도포와 비슷한 모양새의 의상을 입고 있는 무희가 등장하는데, 남색의 붉은 허리띠를 맨 무희와 녹색의 붉은 허리띠를 맨 무희가 앉아 양 손에는 하얀색의 짧은 앵삼과 한삼 같은 것을 들고 춤을 추고 있다.
또한 악인과 무희 들 뒤에는 재주를 부리는 2명의 재인도 등장한다. 이들은 악인의 뒤에서 재주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무희들의 춤이 끝난 후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춤을 추는 무희들과 악사, 그리고 재인들의 통일된 의상형태와 소품 등으로 미루어 전문적인 유랑예인 집단임이 틀림이 없다. 따라서 이 유물은 당대 죽은 이를 위한 영세불망을 묘사했지만 현실적인 춤과 음악이 공존하고 있어 산자들을 위한 연희로도 파악된다. 마치 씻김굿이 죽은 영혼을 달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굿과 같다는 점에서다.
조선시대 빼어난 감로탱화를 통해 당대 연희판에서 전문유랑예인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이 감로탱화가 갖는 사실성이다. 그래서 풍부한 미술도상은 지금까지 문헌적 자료가 제시해주지 못하는 풍부한 시각적 요소를 안겨준다. 그만큼 감로탱화는 사실적인 묘사가 돋보인다.
/전북도문화재전문위원·한별고 교사






 홈
홈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