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작가회의와 함께하는 전라북도 길 이야기] 동행
이소암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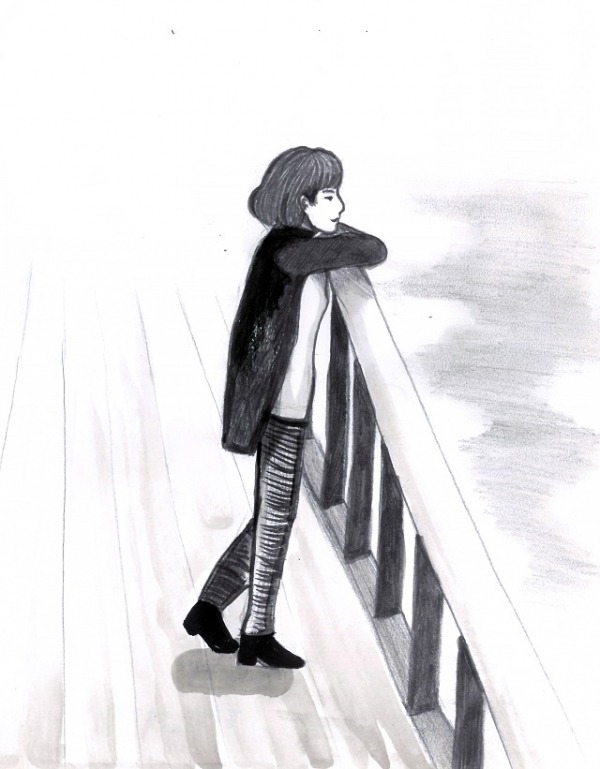
산다는 건 그 무엇으로부터 가벼워지는 일이다. 그 무엇으로부터 점점 벗어나는 일이다. 이것은 은파 호수가 사계절을 동원해, 자신의 온몸으로 내게 준 가르침이다.
요즘 이것저것 생각할 일들이 많아졌다. 적잖이 나이 들면서 그만큼 잡다한 생각들이 몸무게를 늘려가는 탓이리라.
한때는 사는 일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온다 해도 견뎌낼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다. ‘생로병사’라는 질서조차도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고 믿었던 까닭이다. 그러나 어느 날부턴가 이 모든 믿음이 하나둘씩 균열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날이 갈수록 사정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무기력감! 자신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을 경우 찾아오는 이 무기력감은 마치 꿈속의 무의식적 행동을 제어하지 못해 어쩌지 못하는 상황처럼 스스로를 한없이 나락으로 가라앉게 하는 것이었다.
멈춰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너진 마음의 조각들을 치우는 일이 선행되어야 했다. 하지만 무기력 상태에서 그 파편들을 홀로 걷어내는 것이란 안개에게 길을 묻는 것처럼 참으로 암담한 일이었다.
무작정 집을 나섰다. 소위 ‘길치’라 불리는 내가 어렴풋이 은파 호수가 있는 곳을 짐작하며 걸었다. 걸으면서도 만약 길을 잃으면 콜택시를 부르면 될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걸었다. 얼마쯤 가다 보니 은파 호수가 나왔다. 은파(銀波), 햇빛에 반사된 은빛 물결은 나를 마중하듯 굼실굼실 미세한 움직임을 보이며 반짝였다.
바람이 꽃을 불러왔고,
비가 억수로 왔다,
햇볕이 너무 뜨거웠다,
태풍도 몰아쳤다,
나뭇잎이 지고,
눈이 왔으며,
목청 고운 새가 다시…
그렇다. 여러 사계절을 건너면서 나는 조각난 많은 생각들을, 마음들을 은파 호수에 퐁당퐁당 버렸다. 기뻤던 일도 고통스러웠던 일도 힘겨웠던 일도 무수히 버릴 수 있었다. 순전히 맑고 넓은 은파 호수의 품 덕분이었다.
은파 호수는 내 고통의 농도에 따라 어느 날은 잔물결로 쓰다듬어 주었고, 거친 생각은 큰 물결로 덮어 주었으며 늘 ‘괜찮다, 괜찮다’ 달래 주었다. 어느 때는 더 버릴 게 없느냐는 눈빛으로 나를 그윽하게 바라보는 날도 있었다. 그런 날이면 나는 벤치에 앉아, 호수 밑바닥에 버려진 내 생각들이 자라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은파 호수를 걱정했다. 그 생각도 잠시, 정화작용에 의해 그 생각들을 먹어 치운 물고기의 옆구리 살이 도톰하게 올라 있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나직이 속삭이면, 은파 호수는 대답 대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미소를 보여 주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은파 호수는 게으름 피우기 시작하는 나를 역으로 초대하기 시작했다. 봄이 오면 오는 대로 주변에 온갖 꽃들을 피워내곤 나를 불렀다. 숲속 뻐꾸기가 울 때쯤이면 아카시아꽃, 밤꽃 향기를 후르르륵 뿌려놓고, 가는 봄을 환송하자고 또 나를 불렀다. 7, 8월이면 백련·홍련을 띄워놓고, 바람에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수줍어하는 연잎의 모습도 연출해 주었다. 그때마다 수변산책로 개망초꽃은 고개를 쭈욱 내밀곤, 나와 호수와 연꽃의 모습을 번갈아보며 스케치했다. 어디 그뿐인가. 가을이면 숲과 호수는 손을 마주 잡고 화려한 ‘데칼코마니’를 이루어냈고, 밤에는 음악분수와 물빛다리에게 짝을 이루게 하여 탱고를 추게도 했다. 물살도 따라 춤을 추었지만 가끔 스텝이 엉켜 저희끼리 부딪치기도 했다. 그때마다 은파 호수는 흐트러진 융단을 바로잡아 펼쳐주듯 물결을 조심스레 당기곤 했다. 함박눈 내리는 날 은파 호수의 초대는 그중 으뜸이었다. 적갈색 흑룡(黑龍)같은 물빛다리는 마치 하늘의 모든 눈을 불러올 듯 등 비늘을 치켜세운 채 꿈틀꿈틀 비상을 꿈꾸었다. 나도 따라 비상을 꿈꾸었다. 어느 하늘 중간쯤에 이르게 된다면 나, 함박눈이 되어 가장 아름다운 연인, 속눈썹 긴 여인의 눈썹 위에 앉아 그네를 타고 싶었다. 결국 이런 유형의 은파 호수 초대는 단순한 초대가 아니었다. 내가 좀 더, 나날이 더 가벼워지도록 훈련의 훈련을 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은파 호수는 나 스스로, 지난 기억, 그러니까 희로애락의 표상을 지닌 모든 것들을 일부러 흔들어 깨워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수시로 나를 찾아 흔드는 삶의 고뇌로부터 나는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은파 호수 또한 그런 나를 익히 알고 있어 넓은 칠판 가득 구불구불 수많은 글씨를 쓰며 다시 강의를 시작한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나를 불러 일으켜 세운다. 손을 내민다. 함께 걷자고 손을 내민다.
함께 손잡고 걷는 날, 세찬 바람이라도 불어주는 날에는 내게 흥얼흥얼 노래도 불러준다. 바다에 사는 파도처럼 세련되고 우렁찬 음성은 아니다. 높낮이가 거의 일정한 음치 수준이다. 그런들 어떠랴. 서로가 서로에게 스미는 아름다운 순간인 것을, 혼자였으나 결코 혼자가 아닌 동행인 것을!
‘은파 호수를 위해 노란색보다 주황색이 조금 더 많은, 그래서 더욱 곱디고운 노을 멍석을 펼쳐 놓아야겠다. 퇴근하고 돌아와 늦은 저녁을 먹는 아빠 오리도 풀어놓아야겠다. 밤이면 보름달을 대롱, 매달아 놓고 별들에게 거문고라도 울려 보라 해야겠다, 오늘밤 은파 호수가 외롭지 않게!’
*은파 호수는 전북 군산시 은파 순환길 9에 위치하고 있다. 약 53만 평의 규모로 수변산책로는 약 6.5km에 이른다. 전국 100대 관광 명소로 선정되었으며, 은파 호수 위의 물빛다리는 370m이다. 국내 유일의 보도현수교로 알려져 있다.

* 이소암: 군산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졸업. 2000년 『자유문학』 등단. 시집 『내 몸에 푸른 잎』, 『눈.부.시.다.그.꽃!』, 논문 『이상 시 연구』가 있으며,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 글쓰기 전담교수로 활동 중.
전북작가회의와 함께하는 전라북도 길 이야기
아우타르케이아 길 - 박월선 어머니! 당신의 몸길 위를 걸어갑니다 - 김행인 별 - 김성숙 옹골진 전주의 길맛 - 최기우 혼자 걷는 소설 ‘탁류’ 길 - 채명룡 자연과 감응하는 ‘정기용 공공의 길’ - 정기석 천장 - 장용수 걷다, 생각하다, 쓰다 - 이준호 길은 길을 만든다 내 그림자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