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체가 되느냐, 개체에 머무느냐' 고민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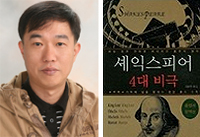
고전문학은 오랜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널리 읽힌 작품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하나의 작품이 망각에 묻히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읽힐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 고전의 지속성은 원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굳이 칼 융의 원형무의식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인간에겐 태고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근간을 이루는 원형이 있다. 고전문학이라 하면 시큰둥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거의 속도의 광기라 불릴 만큼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 와서도 우리가 고전문학을 읽어야 하는 까닭은 우리의 근간을 이루는 뼈대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심연을 들여다보지 않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단 말인가? 고전문학은 결코 진부하지 않다. 고전문학 속엔 과거가 아닌 우리의 내일이 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으로 불리는 햄릿, 리어왕, 오셀로, 멕베스는 지금까지도 널리 읽히는 고전문학에 속한다. 굳이 희곡집으로 접하지 않았더라도 영화나 연극으로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을 접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재해석되어 자주 연극 무대에 오른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희곡집이 아닌 소설이나 동화로 읽은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접했고, 알고 있는데도 필자가 희곡집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을 권하는 이유는 셰익스피어가 인간의 원형을 이루는 핵심을 정확히 짚어 그것을 극으로 집대성했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삶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깨달음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를 대명제로 하는 <햄릿> 은 인간의 증오심을 모티브로 한 복수극이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갈등하고 번민하는가. 그 고뇌의 깊이를 햄릿에서 가늠할 수 있다. 간계에 속아 질투의 화신이 된 오셀로, 혈육 간의 유대의 파괴를 그린 리어왕, 야망이 초래하는 비극적인 결말에 도달하는 멕베스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마주칠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삶이 비극적인 결말에 도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각하게 된다.
비극은 운명론과 모종의 결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운명은 결코 거역할 수 없는 게 아니다. 운명이 촘촘한 그물이라 할 때, 그 씨줄이 외적 요인이라면 날줄은 자기 자신인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서도 외적 요인인 씨줄과 주인공인 날줄이 교묘하게 교차하며 상호 작용한다. 그런데 이 극이 비극적인 결말에 도달하는 것은 주인공들이 자신의 삶에 주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적 요인에 자신을 그대로 내맡겼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어쩌면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조차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생이란 극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은 자신의 내밀한 속에 있다. '주체가 되느냐, 개체에 머무느냐?' 햄릿처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 작가 최일걸씨는 진안 출생으로 우석대를 중퇴했다. 1995년 전북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2010년 제18회 전태일문학상 소설 부문과 5.18문학상 詩 부문에 당선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