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을 수 밖에 없던 비운의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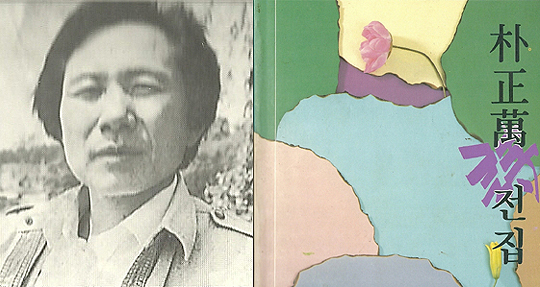
박정만(1946~1988)은 정읍 산외 출신의 시인이다. 그는 1965년에 경희대에서 주최한 전국 고교생 백일장에 시 '돌'로 장원 급제하여 동향의 선배시인 강인한의 뒤를 이어 전주고등학교의 문예 실력을 내외에 자랑하였다. 이태 뒤에는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었고, 1972년에는 문화공보부의 문예 작품 공모에 시와 동화가 당선되어 일찍부터 문명을 날렸다. 경희대 재학 시절 '대학주보'에 소설'낙화유수'를 발표하는 등 중단편소설을 남기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문예지에 시평을 쓰기도 했으며, 수필 속에 자신의 문학관과 일상의 사연을 담아내기도 하였다. 그는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문학적 재능을 표현했지만, 언제나 시인으로서의 몸가짐을 잃지 않았다. 그는 생전에 10권 남짓한 시집을 간행하였고, 2권의 동화집도 상재한 동화작가였다. 이러한 연보를 보면, 그를 '비극적 서정시인'이라고 하기에는 난망하다. 더욱이 그는 한 여학생과 고교 시절부터 사랑을 시작하여 혼인하고 두 딸까지 두었으니, 남부럽지 않은 화려한 경력의 시인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
그러나 박정만의 생은 88 서울 올림픽을 전후하여 참담하게 난자당하고 말았다. 제5공화국의 군사정권이 여의도에서 국풍이라는 이벤트를 선보일 무렵, 그는 이른바 '한수산 필화 사건'에 연루되어 영문도 모른 채 온갖 고문을 당하였다. 그는 평범한 잡지사의 편집자이자 소심한 시인에 불과하던 박정만의 여생은 그때의 후유증으로 절단되고 말았다. 자신의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입은 폭력으로 인해 문우와 사랑하는 여인을 동시에 잃어버린 채, 그는 '두 달 사이에 500병의 술을 쳐죽'이며 '사월 벚꽃 쏟아지듯 쏟아지듯 시를 받아서'('최후로') 전작품의 67%에 해당하는 386편을 썼다. 그는 질긴 목숨을 이어가며 삶의 무게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며 살아내고 있었다. 그러나 일체의 곡기를 끊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인 양 술을 마시는 일과는 그의 신체적 조건을 악화시키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올림픽이 개최되던 중에 '죽어가는 자의 고독'한 포즈로 변기에 앉아서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박정만은 사랑의 시인이었다. 그러나 초기의 작품에서 미처 청산하지 못한 감상적 요소는 평단의 시비를 불러오는 요인이었다. 그는 이혼과 고문 후유증으로 몹시 곤란한 처지에서 '팬지'를 만났다. 그와 동거를 시작한 그녀는 당시 세도가의 영애였다. 그러나 '가난뱅이 삼류시인'과의 애정 행각을 용납할 수 없었던 세력자는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여 둘 사이를 갈라놓았고, 결국 '팬지'는 산사로 들어갔다. 박정만은 '寂光殿을 끼고 도는 미인'('美人의 집')과의 사랑을 통해서 초기의 감상성을 극복하고 절절한 사실감을 획득하였다.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랑은 죽음을 재촉하는 흥분제이다. 스스로 사랑을 가리켜 '소리없이 말로 말하는 괴로움'이라고 부르던 그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매개로 시와 목숨을 맞바꾼 시인이다.
무릇 한번 닥친 죽음의 모습은 박정만의 문학적 자질을 결정적으로 좌우하였다. 그런 흔적은 원시적 속성을 듬뿍 지닌 동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 동화에서 그는 함박눈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느님이 지어주신 눈꽃'이라고 칭했다. 그가 이 작품에서 눈을 맞는 아이들처럼 그가 순수한 표정으로 설경을 묘사한 부분과 그의 고향이 폭설로 유명한 고장인 줄 함께 감안하면, 생전에 '무덤 같이 행복했던 자'('풍장 Ⅲ')로 자처한 안쓰러운 자의식의 실체적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함박눈에 덮인 고향마을에서 행복의 원형을 찾았고, 고향은 죽어서 돌아갈 '무덤'이었다. 이미 죽음을 예상한 그에게 동화는 시쓰기의 연장이었던 셈이다. 이점에서 "착한 사람은 죽어서 그 영혼을 별에 묻고, 그 별의 소금으로 빛나서 사람의 흐린 눈을 맑게 씻어주신다"('별에 오른 애리')는 신념을 형상화한 그의 동화들은 시적 편력과 현실적 사고의 변화 추이를 반영하고 있고, 시와 함께 분석되어야 할 근거를 확보한다.
요즘처럼 서정성조차 상품으로 포장되어 팔리는 시대에, 박정만처럼 한결같이 서정성을 유지하는 자세는 답답한 축에 든다. 그는 '우리 시대의 탁월한 서정시인'이었기에, 지금도 저승에서 조촐한 서정시를 쓰고 있을 것이다. 그의 사후에 지우들이 '박정만 시전집'과 산문집'나는 사라진다 저 광활한 우주 속으로', '나는 해지는 쪽으로 가고 싶다'를 출간하였다. 그리고 그의 슬픈 죽음을 안타까워하던 문우들이 정읍에 시비를 세워 영혼을 위로하였다. 그의 영전에는 유족들이 찾아와 눈물로 화해하였고, 문단은 그에게 유수한 상을 주어 문학적 위업을 기렸다. 이만하면 비극적 삶을 살다간 그에게 보상은 이루어진 셈이다. 앞으로 남은 일은 그의 시적 성과를 조명하여 문학사에 등재하는 일이고, 그보다 앞서 그의 서정시를 즐겨 읽는 사태가 벌어져야 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