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예가족〉 50여년 명맥 이어와 / 〈나루〉·〈부안문학〉 향토색 담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세밑을 앞두고 동인지의 출간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간의 창작활동을 정리하고 저물어가는 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문청(文靑)에서 백발이 될 때까지 50여년간 이어온 〈문예가족〉 동인회와 군산군산여류문학회의 동인집 〈나루〉, 해마다 지역 문인의 작품을 모아 발행하는 〈부안문학〉이 독자를 찾는다.
시, 수필, 단편소설, 평론으로 꾸민 〈문예가족〉 22호는 특별기고로 일본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혼다 히사시 씨가 권찬학 시인을 평한 글을 실었다. 그는 ‘곡비(哭婢)로서의 통절한 자각’이라는 제목으로 권 시인의 시세계에 공감을 표하며 동질성과 친근감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아동문학가 서재균 작가는 ‘하나님의 꽃신 신고 떠났네’라며 고(故) 김훈일 작가를 추억했다. 김 작가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된 사연을 풀고 문학의 길에 발을 들여놓게 된 이야기도 펼쳤다. 이를 통해 서 작가는 바둑에도 일가견이 있고 주변 사람의 곤궁함을 모른체 하지 않았던 김 작가를 회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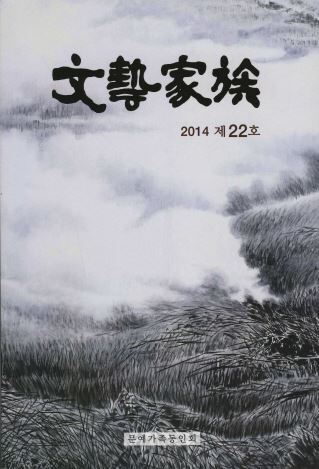
장지홍 문예가족 동인회 회장은 발간 후기에서 “지난 1960년대 ‘헝그리영맨’이라 자칭했던 문학청년의 모임이 세를 불려 오늘날 문예 가족이라는 단체로 성장했다”며 “50여년이나 긴 세월의 강이 흘러간 지금 가죽보다 질기게 불보다 뜨겁게 써 내려온 우리 가족사가 그지없이 눈물나고 자랑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와 함께 각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인집도 선보였다.
군산여류문학회의 16번째 동인집 〈나루〉는 초대시를 게재한 이향아·신순애 작가 등 모두 16명의 작품을 담았다.
이경아 작가는 군산이 명물인 생선 ‘박대’를 소재로 한 시에서 ‘눈을 감지 못했다/소금에 절여 널린 몸뚱이’를 기술하며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원지면 당당하게/양념고추장에 발려 다시 한 번/거룩한 죽음을 애도하는 기쁜 손길/껍질벗긴 맨살이 씹기 좋게 잇 사이에서/쫄깃쫄깃 몸과 몸의 경계 허물어지다/너와 나의 영혼이 감싼 조각/다시 돌아기기 위해 아름다게 덥석 물리다’로 의인화해 먹히는 운명을 재치있게 그렸다.
강명선 작가는 ‘그의 몸에서 아기울음 소리가 난다’는 역설적 표현으로 ‘중년’을 표현했다. ‘뒷걸음친 걸음으로 도망치고 있을 때/어느 사이 아기가 되어버린 중년’으로 인생에 대한 관조를 담담히 서술했다.
전재복 군산여류문학회 회장은 “유난히 사건사고가 많았던 올해 서로서로 상처를 어루만지고 추스르며 다시 알어서야 했다”며 “아름다운 우리의 말과 글로 정성껏 빚은 작품이 많은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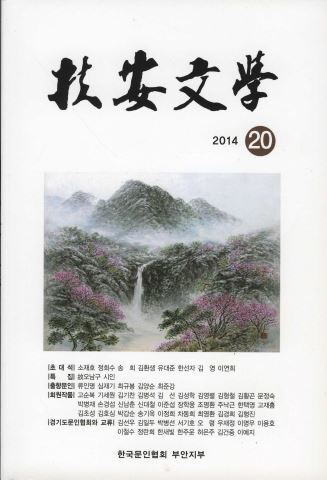
한국문인협회 부안지부는 지역의 자연과 환경을 소재로 한 〈부안문학〉 20호를 내며 지난 2010년 작고한 부안 출신의 고(故) 오남구 시인을 특집으로 다뤘다. 류재명, 심재기 등 출향 문인과 회원 작품을 비롯해 경기도문인협회와 교류도 실었다.
방민호 문학평론가는 오 시인의 작품세계를 평하며 “투병생활로 마지막 국면까지 삶을 생생하게 인식하고자 했던 시인의 태도”를 설명하며 “탈-관념의 시세계와 함께 시론의 터전을 영상과 이미지에서 찾아 직접 관념을 말하지 않고 관념의 형성 이전인 인지 단계의 개념 또는 사물을 묘사해 동영상을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더불어 시를 내놓은 김기찬 작가는 부안의 향토색이 묻어나는 ‘젓갈’을 소재로 ‘곰소젓갈상회 진열장 안’에 ‘죽어도 썩지 못하는 것들이/썩어도 썩을 수 없는 것들이/침샘을 열고 입안 가득 생욕을 끌어당긴다’고 짚었다. 세상을 향해 ‘그대여, 나를 역겁다 마라’며 ‘장작불에 몸 태워 열반에 들 듯/소금 이불 둘러쓰고 비천한 육신 버리려 하느니/코 움켜쥐고 멀리하는 비린 세상/누군들 이맛살 찌푸리며 밀어내지 않겠느냐’고도 외친다. 이어 ‘누구든 비린내보다 더한 독이 있으니/누가 무엇을 역겹다 할 수 있으리/그대여, 다시는 나를 역겹다 마라’고 호소했다.
김초성 작가는 수필을 통해 투병하는 남편을 향해 ‘늦둥이’가 생겼다고 고백한다. ‘힘겨움과 안타까움을 내 빈약한 어깨에 기대며 살아가기 시작한 늦둥이’에게 안타까움을 느끼며 수십 년의 기억을 떠올려 주지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나’라는 막막함도 담담하게 서술해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