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문학관 지상강좌 - 한국문학의 메카, 전북] (16) 화봉 유엽, 전북 문학의 토대 다지고 전주 변혁·문화운동 이끌어
시인·소설가이며, 언론인이자 승려
최초의 연극단체 ‘극예술협회’ 조직
한국 최초 시전문지 ‘금성’ 창간도

“벗이여! 가사이다!/ 이 검은 장막을 걷고 물껼 넘어 저 따로 건너가사이다!/ 벗이여! 및여 멋 가시겠거든/ 내가 먼저 오리다./ 기다릴 쑤 없이 급한 나의 마음은/ 벗이 나의 뒤로 곳 오실 줄 알고/ 나 먼저 가오리다. (...)// 밤새에 길우고 아끼던 살진 나의 팔, 다리를/이제야 이 바닥 우에서 마음껏 시험해보려렴니다./ 어이야! 이 나의 생명의 배는/ 빛을 실러 동녘을 행하여 저어감니다.”
위 시는 유엽 「해 실러가는 나의 생명의 배」(『조선문단』),1927.2)의 부분이다. 이 작품에서 시적 화자는 ‘검은 장막을 걷고’서 ‘해빛을 받아보려고’라는 행위를 통해 새 희망에 대한 의미를 형상화한다. 또한 ‘빛을 실러 동녘을 행하여’에서 ‘생명의 배’로 저어가기 위해 ‘밤새에 길우고 아끼던 살진 나의 팔, 다리를 시험해보렴니다’ 라며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역동적 결의를 표출하고 있다.
전주 출신 유엽(柳葉,1902-1975)은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언론인이자 출판인이고 승려였다. 본명은 춘섭(春燮)이고, 엽(葉)은 필명이며, 법명은 화봉(華峯)이다. 1917년 전주 신흥학교를 졸업하고, 1923년 동경대진제가 일어나자 도일하지 않고 2년 만에 학교를 중퇴하였다. 1920년대 중반부터 여러 방면에 걸쳐 활발하게 활동을 했으며, 1923년 그의 시 「춘원행」이 『동명』을 통해 발표되었고, 1927년 금강산으로 출가한 이후 1975년 서울 법륜사에서 입적할 때까지 시 41편, 소설 7편, 동화 19편, 수필 48편, 평론 20편 등을 남겼다.
그 외에도 그의 행적은 1925년 경성 종로 기독교청년회관에서 노동부인위안음악회에 출연하여 「조선 노래」를 독창하였다. 1926년 전주공회당에서 열린 전주시회 주체 문예강연회에 참석해 ‘생과 사’에 대한 주제로 강연하였으며, 1945년 한국민주당 발기인으로, 1946년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문교부장으로 선출되었다. 1953년 해인대학 교수와 1954년에는 영남일보 주필로 활동하였으며, 제3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출마하여 낙선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의 시기에서 당시 식민지 문단은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계급문학이 성행할 때였다. 이 때 예술지상주의를 신념으로 삼은 유엽은 카프집단에 맞서 “진실된 예술품은 예술지상주의적 정신에서 산출된 예술품을 일음이오 한 그러한 진실한 예술품이라야만 과연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구원”(「나의 예술관초」)이라며 강한 주장을 내세웠다. 또한 “말이 벌써 음률적으로 되어 가지고 모름지기 사람의 감정에 부합이 되도록 되어저야 되는 것”이라며 그의 시론은 1930년대의 순수시 운동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초창기 예술 활동의 시작은 연극에서 비롯되었다. 1921년 3월 일본 와세다대학에 재학 중 김우진, 최승일, 조명희 등 일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극예술협회’를 조직하였고, 그해 7월 조명희의 원작 「김영일의 사」에서 주연 배우로 김영일 역을 맡아서 극예술협회 회원들과 전국을 순회하며 공연하였다. 그리고 신인 발굴과 후배 문인들을 지원하였으며, 음악에도 관심이 많아 외국 곡의 가사도 번역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연극사의 첫머리를 장식한 인물인 동시에 전라북도 연극운동의 창시자가 되었다.
이러한 문단 활동을 시작할 무렵, 1923년 11월 한국 최초의 전문지 『금성』을 창간하게 된 것이다. 동인은 손진태, 양주동, 백기만 등이었다. 여기서 그는 『금성』의 발간 자금을 조달을 비롯하여, 편집과 출판, 당국의 검열 그리고 신인 추천 문제 등을 담당하는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금성』의 주재자는 양주동으로 단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 때 유엽은 가친 상을 당해 전주로 내려 왔을 때 양주동은 자신의 이름을 편집인으로 내고 일본으로 건너가 버렸다. 그래서 『금성』의 편집인이 바뀌고 발행마저 중지된 것이다. 따라서 『금성』의 편집과 발간을 주재한 유엽의 역할에 대한 기존 서술 내용과 문학사적 왜곡은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一千九百二十三年/ 地殼이얼기始作하든첫날/ 내집에 오는길電車에서 나는/ 매우 沈着한 少女를 맛낫서라/ 초생달갓흔그의두눈섭은/ 가장아름다워 그린듯하고/葡萄酒빅삿흔그의입술은/ 달콤하게도 붉엇섯다/ 그러나 도럄직하고 귀여운 그얼골에는/ 맛지안은 근심빗이도라잇고/ 웬섬인지힘을일코 보는 두눈가에는/ 桃紅色의어림빗이 도라라.”
위 작품은 유엽의 시 「少女의 죽엄」(『금성』제2호, 1924.1)의 일부분이다. 여기에서 한국 현대문학사는 김동환의 『국경의 밤』(1925)을 최초의 서사시로 기술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이보다 앞서는 것으로, 한국 근대 서사시의 효시를 이르는 작품이며, 3부 34연 142행에 이르는 장시이다. 최명표의 「범애주의자와 시론」 논문에 의하면 이 시는 근대적 비극의 표지로서 ‘소녀의 죽엄’을 문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적 화자는 필연적 사건의 결과로 인해 소녀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그男子’의 완력과 ‘사회의 폭력성’을 상징적으로 제시한다고 고찰하고 있다.
또한 그의 시 「落葉노래」에서 ‘가을밤 구으는 落葉 소래는’을 통해 개인의 정서가 묘사되고 있다. 「겨울밤의 哄笑」의 시는 ‘빗없는 골방’의 고립에서 ‘새로이며노흔골방’으로부터 다른 삶으로의 ‘몽상’을 꿈꾸기도 했던 것이다. 마침내 그는 「感傷의 斷片」의 작품에서 ‘어린애의 얼굴’의 웃음처럼 생명의식에 대한 노래를 통해 범애주의적 신념을 펼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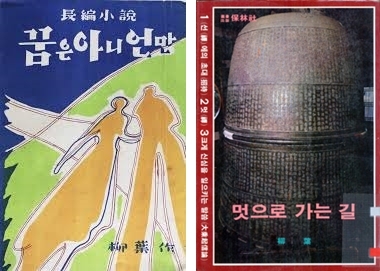
그의 문학 활동은 1931년 2월 자가본 시집 『임께서 나를 부르시니』를 간행하고 출판 했지만 원본은 찾을 길이 없다. 1939년 장편소설 『꿈은 아니언만』을 고려사에서 발행한 후, 1953년 이 소설은 덕홍서림에서 재간행되었다. 또한 1962년 『華峯譫語』과 『無低船』이 발행되었고, 1971년에는 불교의 난해한 『대승기신론소』 등을 순한글로 해설한 『멋으로 가는 길』이 발행되었다.
그의 소설 『꿈은 아니언만』은 변화영의 「유엽의 자전적 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의미」 논문을 통해 연애의 서사의 장소는 전주와 동경 간의 대립적 공간을 통해 하나의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소설의 내용에서 “동경은 연애가 탐닉의 대상이자 사업의 일환으로 변질된 곳이고, 조선인에게는 식민성 재생산의 텅 빈 공간일 뿐이다. 전주는 민족 공동체 조선의 발상지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환시하고 있으며. 존재의 근간이자 세계의 중심은 전주로, 그가 전주라는 장소에서 ‘흔적’에 주목하였다.”고 논하고 있다.
또한 그는 평론을 자주 집필하였다. 그 중 『詩와 萬有』에서 詩를 쓰는 벗님들에게 “詩는 모든 것의 極致올시다. 宗敎, 道德, 法律, 이 모든 것의 우에 잇습니다. 詩人은 豫言者외다. 自然의 深奧한 妙理와 宇宙의 眞理를 天眞爛漫하게 노래하는 者외다.”라는 글로 시인이 되는 자질을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화봉스님은 『華峰柳葉』에서 “선은 멋이다. 살림살이이다. 이 누리로 더불어 한 풀이 되어 멋지게 어울려 살아가는 노릇이다.”며 禪을 멋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유엽은 여러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여 큰 족적을 남겼다. 그 중에서 그의 공은 놀라울 만큼 크고 넓다. 그 중에서 만해 한용운과의 특별한 인연에 힘입어 괄목할만한 불사를 일으켰다. 유엽이 한용운이 주재한 잡지 『불교』 의 발간을 도운 것이나, 불교 청년운동과 종단 정화 사업 등에 앞장선 것, 일제 말기에 아나키즘운동에 가담한 것 등은 순전히 한용운의 영향이다. 유엽이 특히 힘쓴 분야는 불교대중화운동이었다. 그의 글쓰기는 대중불사를 일으키려는 의지의 표현이고, 난해한 불경들을 순한글로 풀어 옮긴 것도 그것의 실천이었다.” (『유엽문학전집Ⅰ』)
지금, 전남 송광사 유엽의 「행장비」에는 “스님께서는 色相이 端嚴하고 辯才가 出衆하시며 마음이 너그러워 좋은 일이나 언잖은 일이나 一切 執着하지 안았고 무슨 일이든지 責任을 지면 勇氣로 臨하였고 因緣이 다하면 果敢하게 물러나셨다. 慈悲는 봄바람 같고 威嚴은 秋霜같았다.” 라고 적혀 있다. 한 평생 문학과 예술, 불교에 전 생애를 바친 삶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아울러 그에 대한 문학사적 평가가 하루속히 착수되어 전북지역 문학연구를 통해 전작품을 발굴하여 소개하는 기회가 오길 기대한다. “오날부터/ 새해라는데/ 때마츰/ 눈이나리네/ 고요히 밝는/ 이 따우에/ 깨끗한/ 눈을 나리네/ 어나듯 이몸도 눈이 되었나/ 고요히 이따우에/ 눈이 나리네.”
/김명자 전라북도문학관 학예사
전북문학관 지상강좌 - 한국문학의 메카, 전북
(56)어휘와 어법에 천착, 비평의 새 길 연 오하근 평론가 (54)선명한 이미지와 체험으로 풍속화를 그려낸 시인, 최영 (53)아름다운 낭만주의자, 막이야기꾼 형문창 소설가 (52)“시(詩)를 종교로 시작(詩作)을 신앙”으로 살아온 시인 이기반 (51)분단의 비극을 피흘림으로 풀어낸 시인 김영 (50)풍자와 해학, 후덕한 인품으로 세상의 빛이 된 작가 라대곤 (49) ‘불멸의 애국혼’되살린 논개(論介) 시인, 고두영(高斗永) (48) 삶과 詩가 질박하면서도 올곧았던 서래봉 시인, 박찬 (47) ‘불광불급(不狂不及)’의 수필 쓰기로 행복한 삶 일군 김학 수필가 (46) 근원적 고통을 문학으로 풀어낸 시인 이목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