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황지호 소설가, 모악작은도서관 ‘까치밥 시동인 회보 13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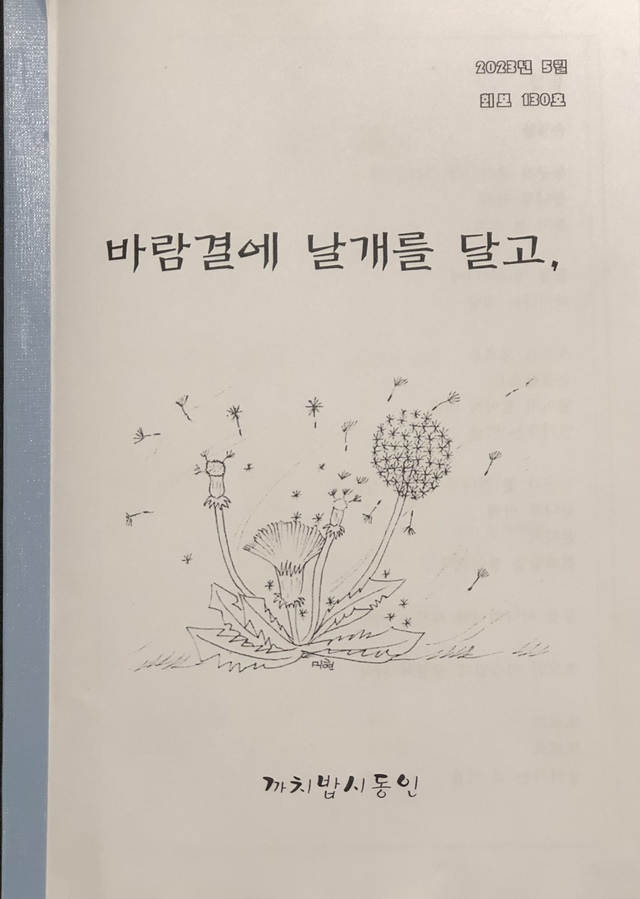
‘시(詩)가 뭐냐’는 질문에 김종삼 시인은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라는 시에서 ‘엄청난 고생 되어도/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이 세상에서 알파이고/고귀한 인류이고/영원한 광명이고/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답한 바가 있습니다. ‘시’의 본질을 묻는 ‘우문’에 삶의 근본을 밝힌 ‘현답’으로 응수한 시인의 혜안에 고개를 끄덕이긴 했습니다만, 정작 ‘알파’의 삶에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활자와 문장의 바다, 추상과 관념의 미로, 이익과 손해의 구렁만 헤맬 뿐 행간의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순하고 명랑하며 귀하고 슬기로운 사람들께서 다달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었음에도 10년을 허송세월했습니다.
10여 년 전, 모악산 주변에 사는 주부들께서 동인을 결성하고 글 강의를 청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시(詩)라는 글자를 파자 하면 절(寺)에서 스님네들이 하는 말(言)로서 그 뜻은 세상살이의 부질없음과 형언할 수 없는 깨달음을 전하며, 그 소리는 불경 소리의 율격을 닮아 멀리 저승까지 퍼진다.’ 라는 그럴듯한 말에 속아 한 계절 허언을 경청하셨었지요. 매시간 책상 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해 주셨고, ‘작가님’이라 공손히 불러 주셔서 어깨가 천장까지 닿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의 인연을 잊지 않고 삭망에 맞춰 회보를 보내주셨습니다. 130호째 입니다. 답을 한 적도 없고, 좋다 나쁘다 뜻을 전한 적도 없는데, ‘우공이산’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 우직함이나 무던함보다 더 위대한 것은 내내 시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시를 쓰기 위해 마음을 들여다보고 삶을 반추했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숲에서 단어의 나무를 흔들어 치마폭에 문장을 담아왔다는 것입니다. 정작 20년 전 시 쓰기를 포기한 저에게, 허황한 말을 난발하는 저에게, 인연을 그리 소중히 여기지 않는, 부족한 저에게 죽비 소리를 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무연히 앉아 그 가르침을 들여다봅니다. 회보도 책이라면 책인데 면지나 헛장도 없이 표지 뒷면이 바로 본문입니다. B4 크기 종이 양 면에 네 페이지를 인쇄하여 반절로 자른 뒤 스템플러를 박아 만든 회보는 총 10장, 20 페이지입니다. 연하늘색 색지를 붙여 스템플러 박은 자리를 가리고 ‘책등’을 만들었습니다. 스템플러를 박은 마음은 단정하고 색지를 붙인 손길은 고와 수수하고 정갈한 옷감 같습니다. 회보가 곧, 시를 품고 있는 누대의 배냇저고리 같습니다.
‘바람결에 날개를 달고’라는 제호 아래에 씨앗이 흩날리는 민들레 한 포기를 그리셨습니다. 씨앗이 어지럽게 날리니 바람은 분명 왜바람. 그 바람 타고 표지 밖으로 날아가는 민들레 씨가 이소영, 김숙미, 김설강, 유선희, 백경남, 김미현, 권명화 시인께서 지금까지 보내주신 소식 같습니다. 내려앉은 곳을 본 적이 없으므로 지금도 멀리 퍼지고 있을, 꽃을 피운 적이 없으므로 세상 모든 꽃을 품고 있을 시(詩)의 씨앗, 당신들의 마음 같습니다.
이제 일곱 분만 남은 동인은 여섯이 되고 다섯이 되었다가 언젠가는 사라지겠지요. 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라진다고 사라지는 것이겠으며 보이지 않는다고 안 보이는 것이겠습니까. 바람 따라 사라졌던 꽃씨가 봄날 온 들판을 수놓는 것처럼 선생님들의 노래도 여기 그리고 그곳, 지금 그리고 그때, 당신 그리고 내 안에서 피고 지지 않겠습니까.
황지호 소설가는
2021년 전북일보 신춘문예 소설 부문으로 등단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황보윤 소설가-황석영 ‘할매’ 김영주 작가- 김헌수 ‘내 귓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 날’ 이경옥 동화작가-이라야‘파이트’ 오은숙 소설가-이희단 ‘청나일 쪽으로’ 기명숙 작가, 지연 ‘모든 날씨들아 쉬었다 가렴’ 이진숙 수필가-하기정 ‘건너가는 마음’ 장은영 동화작가-윤일호 ‘거의 다 왔어!’ 이영종 시인 - 황유원 시집 ‘하얀 사슴 연못’ 장창영 작가- 징 지글러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최기우 극작가-정양 ‘헛디디며 헛짚으며’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