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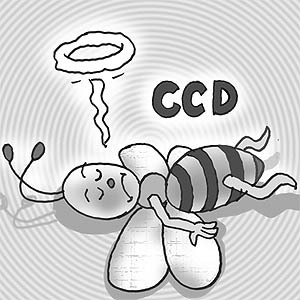
미국의 생물학자이며 작가인 레이첼 카슨은 1962년 ‘풀들이 시들어가고,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당시 생태계의 모습을 자신의 저서 ‘침묵의 봄’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1950∼60년대 미국 전역에서 보고된 수 많은 환경피해 사례들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수집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녀의 노력으로 DDT 같은 유기염소제 농약의 독성이 밝혀지고, 후에 규제되는 근거가 되었다.
지난해 미국에 이어 최근 유럽에서 까지 꿀벌의 개체수 감소로 떠들썩하다. ‘벌떼 폐사 장애(CCD)’로 불리는 이같은 현상은 25% 정도 꿀벌들이 벌집 밖에 나가 죽어버리는 비슷한 현상이 다발로 나타나고 있다. 벌집에 사체가 없다보니 원인 규명도 어려운 모양이다. 기생충이나 바이러스, 유전자 변형 농산물 때문이라는등 갖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다. 일부 학자는 휴대폰 전자파 탓이라는 주장도 있다. ‘침묵의 봄’ 처럼 원인은 어떻게든 밝혀지겠지만 인간이 만든 재앙이 아닐런지 우려된다.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만약 세상에 꿀벌이 사라진다면 인류는 4년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꿀벌은 꿀만 만들지 않는다. 사과, 딸기등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가 꿀벌의 수분(受粉)작용에 의해 결실을 맺는다. 인류가 먹는 식품 가운데 3분의1이 곤충의 수분으로 생산되는데 이중 80%를 꿀벌들이 해낸다. 가축의 사료인 알파파도 꿀벌의 수분으로 생산된다. 꿀벌이 없으면 육류생산도 곤란해진다는 얘기다.
국내의 경우 아직 집단폐사 현상이 보고되고 있지는 않지만 올 봄 꿀생산이 흉작을 거듭하면서 양봉농가들이 철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무분별한 농약사용과 함께 꿀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밀원(蜜源)인 아카시아나무의 황화(黃化)현상으로 꿀 생산이 현격히 감소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생물 다양성의 훼손은 먹이사슬등 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인류도 예외일 수 없다. 생태계가 균형을 잃게되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류가 지식사회와 정보사회를 이루고 첨단 과학기술로 우주를 누벼도 미물인 꿀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없다. 지속 가능한 생물 종(種)의 군(群) 유지와 회복을 통한 생물 다양성 보전에 보다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오목대
새만금 오픈카지노 도입 백제금동대향로가 건네는 질문 교사·교수·행정가, 적임자는? 우물안 개구리(井底之蛙) 노인일자리 사업의 방향 부자 전북, 가난한 전북 마천루 위에 앉은 AI설계자들 [오목대] 호가호위(狐假虎威)의 계절 광주 전남 반면교사로 삼아라 세계유산, 유곡리·두락리 고분군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